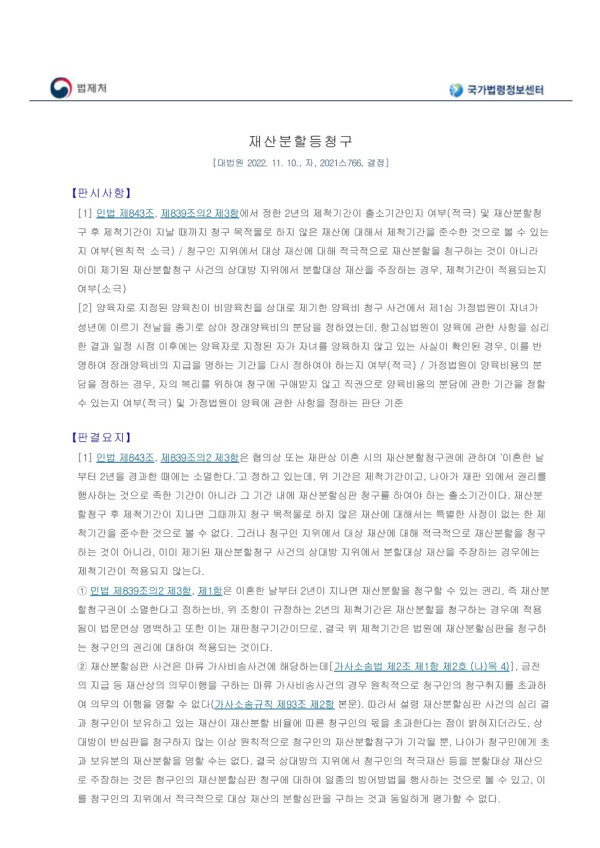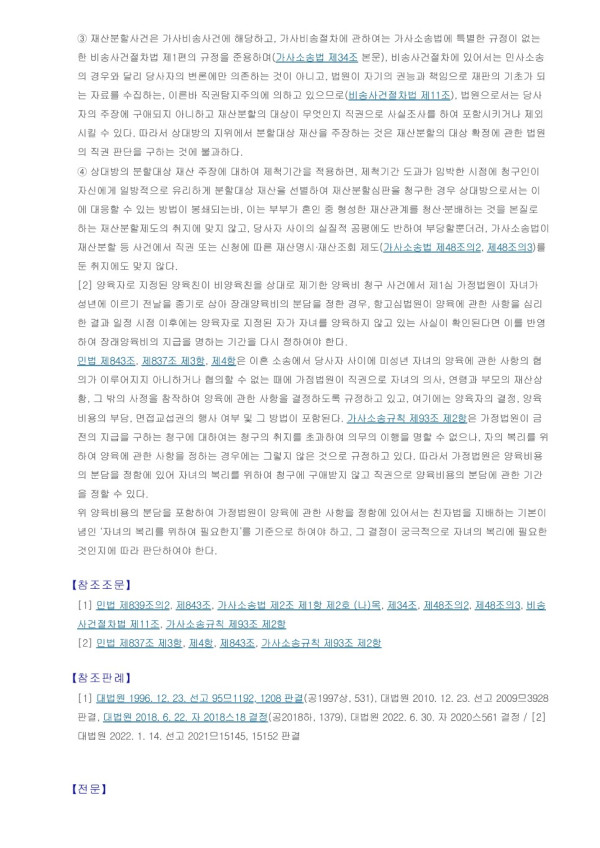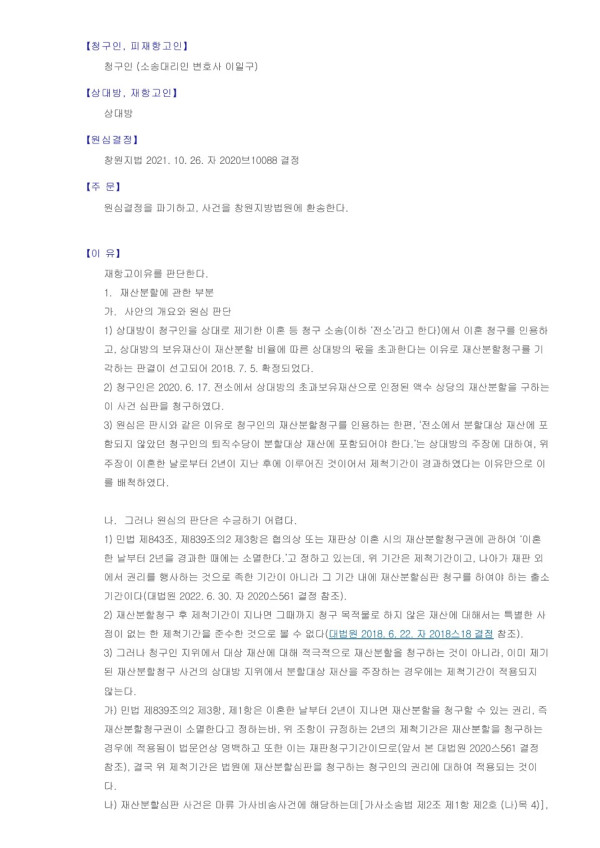[황소영 변호사] 재산분할 - 2년이 지난 후에 한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항변은 정말로 받아들여질 수 없나요?
페이지 정보

본문
Q. 이혼 후 2년이 다 되었을때쯤, 갑자기 전 배우자가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이혼 당시 재산분할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 분할을 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저는 소송절차에 대해서 잘 알지못했던 터라, 추후에 답변서를 내고 소송에 응했습니다.
저도 전의 이혼소송에서 포함되지 않은 전배우자의 퇴직금도 재산분할 해달라고 재판부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제가 재산분할 해줄 금액이 줄어들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제 주장에 대해서 2년이 지난 재산분할청구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는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없나요?
A. 안녕하세요. 황소영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에 대해 알아보면서,
이혼 후 진행하는 재산분할청구 사건역시 비송사건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사비송사건의 경우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지요.
제34조(준용 법률) 가사비송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을 준용한다. 다만,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법제처-가사소송법
제11조(직권에 의한 탐지 및 증거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법제처-비송사건절차법
따라서 이러한 이혼 후 재산분할의 경우 상대방의 지위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주장하는 것은
재산분할의 대상 확정에 관한 법원의 직권 판단을 구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편, 재산분할청구권은 언제든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그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그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법제처-민법
이 2년이라는 시간은 제척기간일 뿐만아니라, 재판 외 청구도 불가능한 출소기간에 해당하는데요.
따라서 재산분할청구 후 2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봅니다.
(대법원 2018스18 결정 등 참조)
그렇다면 정말로 질문자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일까요?
원심은 위 제척기간이 지났음을 사유로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상대방의 지위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민법 제839조의 2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진다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 적용됨이 법문언상 명확합니다.
따라서 이 제척기간은 청구인의 권리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가사비송사건은 원칙적으로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초과하여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가사소송규칙에 따르면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취지를 초과하여 이행을 명할 수 없습니다.
제93조(심판의 원칙등)
①가정법원은 가정의 평화와 사회정의를 위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청구의 목적이 된 법률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의 심판을 하여야 한다.
②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기타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는, 그 청구의 취지를 초과하여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없다. 다만, 가정법원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제처-가사소송규칙
즉, 만일 재산분할심판 사건을 심리 한 결과로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청구인의 몫을 초과한다는 점이 밝혀지더라도,
만일 상대방이 반심판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청구인의 재산분할청구가 기각될 뿐입니다.
나아가 청구인에게 초과 보유분의 재산분할을 명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지위에서 청구인의 적극재산 등을 분할대상 재산으로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의 재산분할심판 청구에 대하여 일종의 방어방법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인의 지위에서 적극적으로 대상 재산의 분할심판을 구하는 것과
상대방의 지위에서 항변을 하는 것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2년이라는 제척기간을 상대방에게도 적용을 하게 되면 당사자 간의 실질적 공평을 반하게 될 수도 있다고 설시하는데요.
제척기간 도과가 임박한 시점에 청구인이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분할대상 재산을 선별하여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다면
상대방으로서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봉쇄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실질적 공평에도 반할뿐더러,
가사소송법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른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를 둔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본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한 청구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을 그 제척기간을 이유로 배척한다면
그것은 재판결과에 큰 오류가 있다는 것이겠지요.
이에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제척기간이 지난다면 재판 외 절차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면, 2년의 시간이 지나기 전에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그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황변의 솔루션
관련링크
- 이전글[조정근 변호사] 합의로 차임 증액하는 경우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24.01.12
- 다음글[황소영 변호사] 혼외자인 저희 형제는 대만 교포인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24.01.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