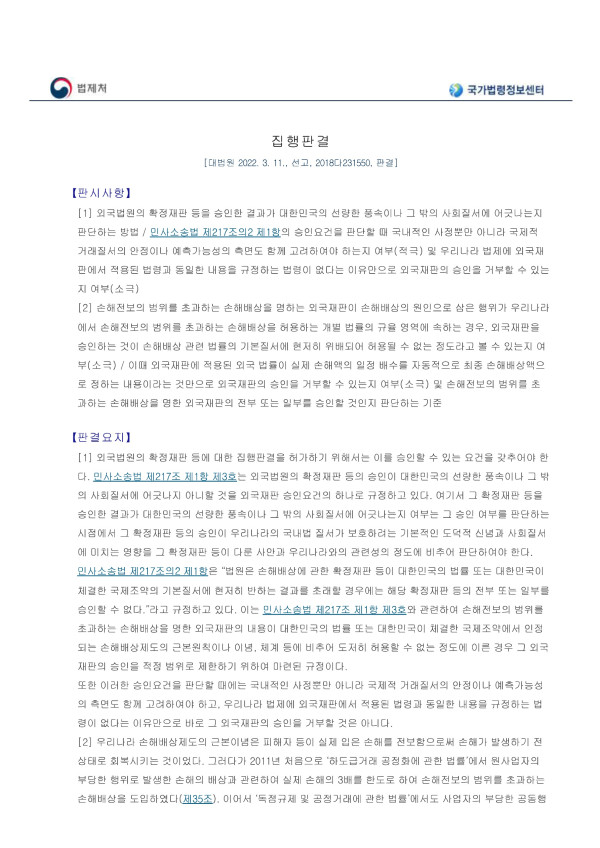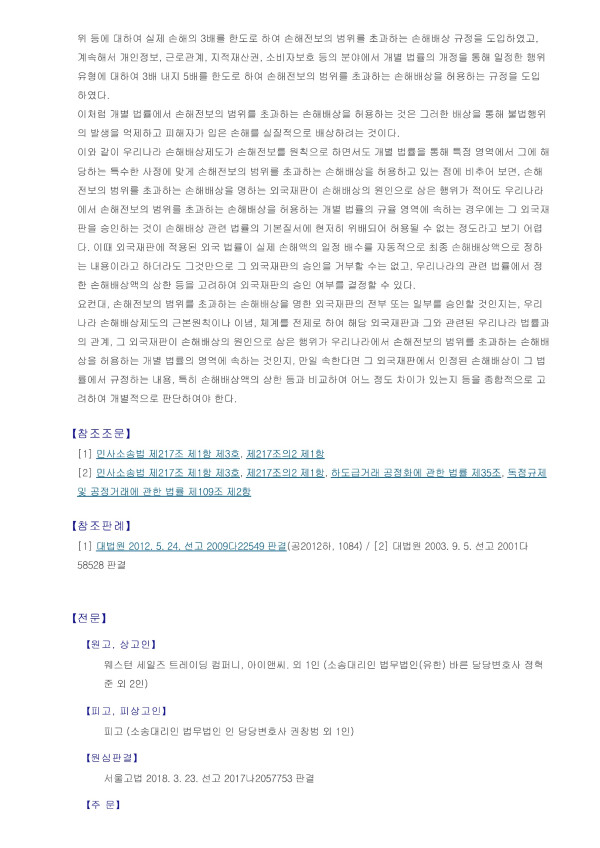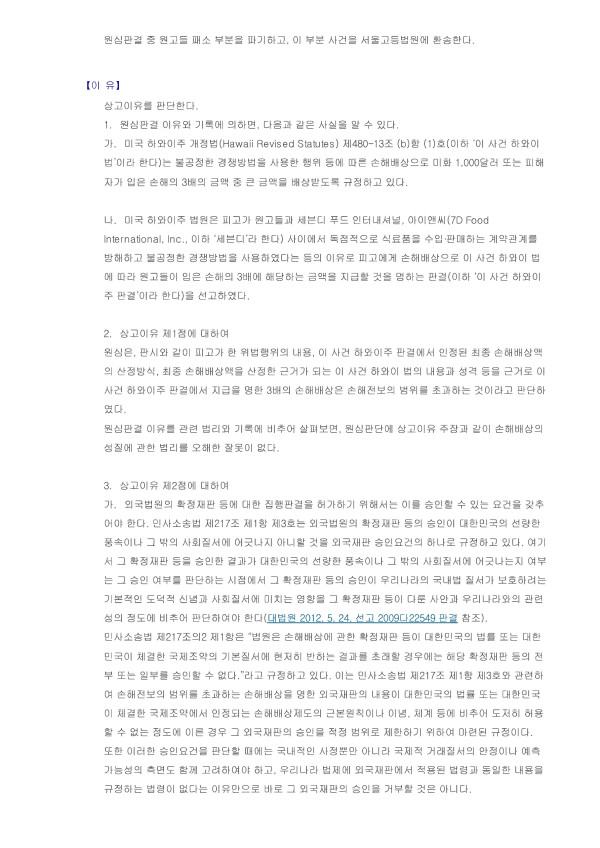[황소영 변호사] 교포소송 - 외국에서 받은 판결문으로 강제집행 하는 방법
페이지 정보

본문
만일 외국에서 판결문을 받았는데, 강제집행 할 대상이 대한민국에 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외국에서 정당하게 받은 판결문이라면, 언제든지 대한민국에서 집행이 가능할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외국에서 받은 판결문만으로 대한민국에서 집행이 바로 가능하다면, 피고에게 큰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외국의 판결문이 대한민국에서 그 효력을 인정받지 위해서 필요한 4가지의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해당 판결을 받은 외국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을 것,
패소한 피고가 소송절차에 있어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했을 것,
판결을 인정할 때,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
상호보증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판단하는 것은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단계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강제집행절차는 권리의 확정에 의해서 분쟁을 관념적으로 해결해주는 판결절차와는 달리, 분쟁을 사실적, 종국적으로 해결해주는 단계로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그 요건만을 확인하여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행을 할 수 있는지 그 여부가 되는 집행문의 발급을 위하여서는 외국판결문의 효력의 확인받는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바로, 집행판결을 받는 절차입니다.
집행판결
집행판결은 재판권이 있는 외국의 법원에서 행하여진 판결에서 확인된 당사자의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강제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시 소를 제기하는 등의 이중절차를 강요할 필요없이 그 외국의 판결을 기초로 하되,
단지 우리나라에서 그 판결의 강제실현이 허용되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 이를 승인하는 절차입니다.
(대법원 2009다68910 판결 참조)
이 때 강제집행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기존에 알아보았던 민사소송법 217조의 네가지 요건을 확인하여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첫번째 요건인 국제재판관할권의 경우, 국제사법에서 해당 외국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두번째 요건인 피고의 방어권 행사 역시 당해 사건기록을 확인하면
공시송달, 혹은 그에 준하는 송달방법에 의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겠지요.
논쟁이 있을 수 있는것은 217조의 3항과 4항에 해당하는데요.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것은 명확한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사안에 따라 달리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을 것은 어떤 기준으로 보게 될까요?
대법원은 이에 관해서 사회질서에 그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서 그 확정재판 등의 승인이
우리나라의 국내법 질서가 보호하려는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그 확정재판 등이 다룬 사안과 우리나라와의 관련성의 정도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제1항은 법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의 승인에 관한 조항으로
해당 확정재판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와 관련하여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재판의 내용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원칙이나 이념, 체계 등에 비추어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
그 외국재판의 승인을 적정 범위로 제한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입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손해전보에 관하여서는 개별 법률의 개정을 통해 일정한 행위 유형에 대해 3배 내지 5배를 한도로 해서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에따라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것인지는,
우리나라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원칙이나 이념, 체계를 전제로 하여
해당 외국재판과 그와 관련된 우리나라 법률과의 관계, 그 외국재판이 손해배상의 원인으로 삼은 행위가 우리나라에서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개별 법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만일 속한다면 그 외국재판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이 그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
특히 손해배상액의 상한 등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대법원은 설시하였습니다.
이렇듯, 외국판결에 근거하는 조항이 우리나라와 전부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개별적인 법률의 규정을 면밀히 살펴서
그 상호보완성 등을 살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만큼 외국의 판결문을 꼼꼼히 확인하여 우리나라의 법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변호사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경험을 쌓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판결문의 효력을 승인받아야 하겠습니다.
집행판결은 간단한 청구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이 인정되어야만 판결문의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황변의 솔루션
- 이전글[조정근 변호사] 산재 사건 2심 승소 24.01.11
- 다음글[황소영 변호사] 교원의 직위해제처분에 관한 불복방법 24.01.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